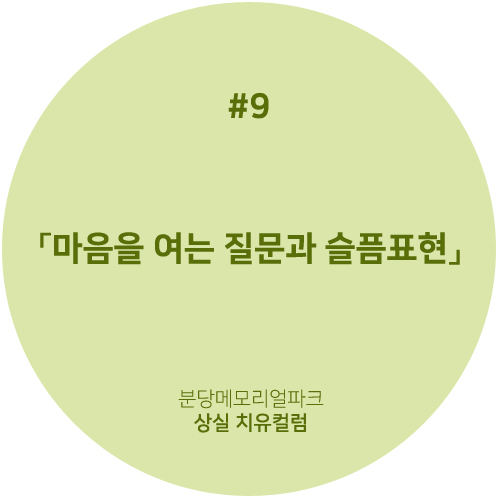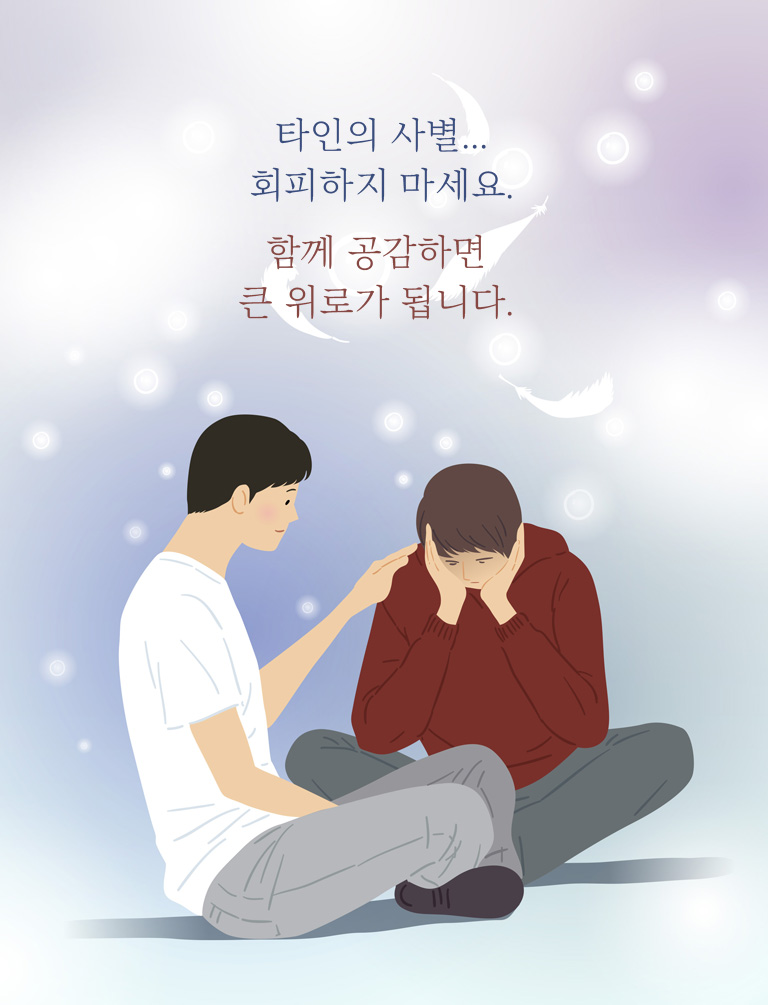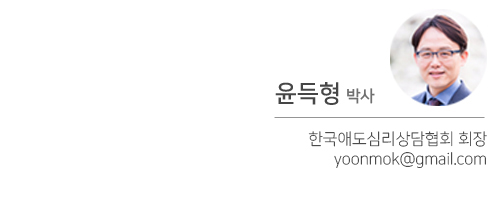|
안녕하세요. 분당메모리얼파크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상실 치유컬럼'에 아홉 번째 글이 발행되어 소개 드립니다.
친구 혹은 지인이 사별을 하였거나 이야기 도중 사별경험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회피하시거나 애써 화제를 바꾸려 하시진 않는지요?
서로 위축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진정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애도 상담 전문가 윤득형 박사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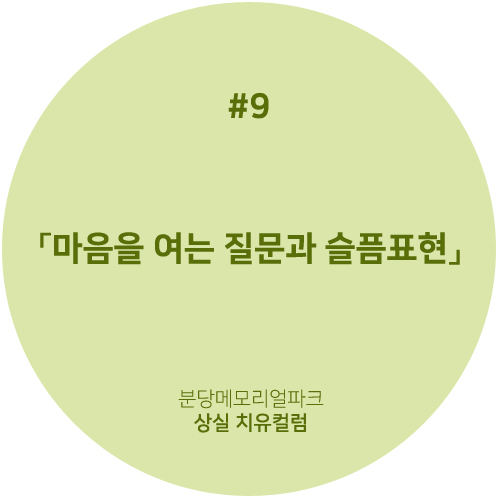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그 때가 대학교 1학년 때니, 다른 사람들 보다는 조금 일찍 아버지를 잃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던 중에, 아버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저는 아버지가 안 계세요”라고 대답을 했었다. 거의 모든 사람의 반응은,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물론, 그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만, 가끔 연배가 비슷한 사람에게 나는 이어서 말한다. “뭐가 미안해요?”라고 말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저 우물쭈물 말을 마무리한다.
사실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언제,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냐고 물어주는 편이 더 낫다.
‘미안하다’는 말은 상대방과 내게 잠깐의 대화의 단절과 오히려 더 어색함을 가져온다. 어쩌면, 뭐라 해줄 말이 없어서, 다른 대화로 넘어가자고 하는 무의식의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사실 자연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이때를 그냥 지나치면 다시 물어볼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상대방에게 슬픔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슬픔치유는 그 슬픔을 표현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Empathetic Listening)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드러나게 하고, 확인시켜 줌(Validating Feelings)으로서 슬픔을 표현하고 치유가 되도록 도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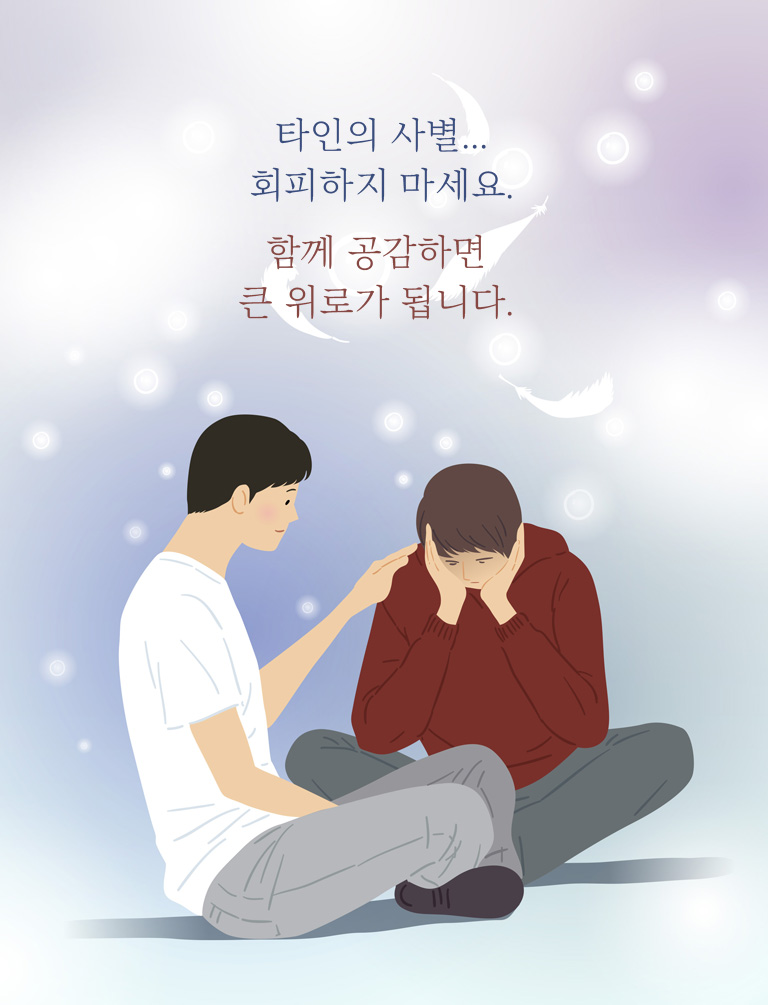
미국 클레어몬트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두 번째 학기였다. 나는 상담학계서 유명한 클레멘트 교수(William Clements)의 수업을 선택하여 들은 적이 있었다. 강의 제목은 사별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상담(Pastoral Care and Counseling for Bereavement)이었다.
첫 수업이 끝날 무렵 클레멘트 교수는 과제를 하나 내 주었다.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상실의 경험들을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래프를 그려서 표시하고, 그 상실은 어떤 건지, 그때 내가 무엇을 느꼈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 써오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래프에 19살에 표시를 하고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쓴 후, 그 때 경험했던 것들, 그 때의 감정들, 지금에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세장 정도의 페이퍼를 작성하였다. 다음 수업시간이 되었다. 한명씩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상실 경험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나의 상실 경험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을 하고, 내가 쓴 페이페를 읽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만, 병든 아버지를 제대로 간호하지 못한 나의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읽던 중에 감정이 요동치며, 말이 막혀버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였다. 한참 동안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게 정적이 흐르는 교실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 체 조용히 흐느끼며 훌쩍거리다 그만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그만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이 정도면 교수님이 뭔가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 생각지만, 교수님은 아무 말도 안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10여분 정도가 흘렀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읽고 있던 페이퍼를 접어놓고, 왜 내가 이러한 감정들을 표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아버지 간호에 힘이 드셨던 어머니에게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나의 이야기가 다 끝난 후, 교수님은 학생들 모두 손을 맞잡게 한 후에 잠시 나를 위한 기도를 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슬픔치유는 이렇게 표현됨으로 시작이 됨을 알려주셨다. 그밖에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편지로서 내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생각해보니, 나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나의 이러한 감정을 제대로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친한 친구들에게 조차도 부끄러운 마음에 이야기하지 못했었다. 아버지는 3년여 짧은 기간 병으로 누워계셨지만, 그 기간 나는 수많은 감정들로 괴로웠다. 환자가 누워 있는 집안의 공기를 느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었고, 일부러 늦게 들어가기도 했으며,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귀찮다고 여길 때도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심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아무에게 나의 감정을 토로하지 못했다. 게다가, 누가 내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본 적도 없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저 ‘미안하다’는 말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울음을 받아줄 신뢰할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애도수업』을 쓴 케시 피터슨은 자신의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이 보인 첫 반응은 ‘회피’였다고 한다. 암은 전염병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피하는 걸까? 그 이유는 ‘뭐라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겪게 되는 절망적인 경험 앞에서 뭐라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뭐라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와 똑같이 대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다고 알면서도 아예 모른 체 할 수 없기에 “좀 어떠세요?” 정도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여는 것도 좋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사실이다. 아마 마주하는 것도 불편하여 만남을 피하거나 마주치는 것조차도 꺼려할 수 있다. 물론, 적당히 할 말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말을 할 필요도 없다. 진실한 한마디의 질문이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아이들은 잘 지내나요?” 등의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윤득형의 『슬픔학개론』 중 일부 인용 ▶ 상실 치유컬럼 '다른 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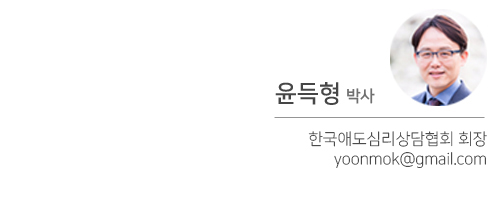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