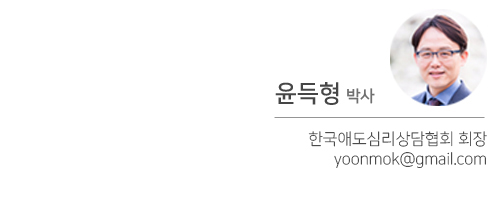새소식
분당메모리얼파크의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메모리얼 人· 禮 · 通]상실 치유컬럼 #7_진실한 위로 |
2019.10.10
조회수 7517
|
|---|---|
|
안녕하세요. 분당메모리얼파크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상실 치유컬럼'에 일곱 번째 글이 발행되어 소개 드립니다.
인생에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있다. 벌써 30년 전 일이다. 루게릭병으로 3년여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경황이 없는 터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가장 친한 친구가 빈소도 차려지기 전인 나의 집으로 달려왔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친구는 나를 와락 안아주었다. 이때가 내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의 순간이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친구와의 진한 포옹, 그리고 그날 함께 흘리던 눈물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문상을 가면 되도록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정말 ‘뭐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위로의 말도 당시에는 크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게 위로의 말을 찾기 위해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해 준다. 그래도 뭔가 이야기하고 싶다면 솔직히 말하라고 한다. (위로의 말을 찾으려 아무리 애를 써 봐도) “뭐라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이다. 진심이 담긴 이 말은 장례식장에 와서 함께 있는 그 자체와 함께 깊은 위로를 전해 줄 거라 믿는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이다. 어느 저녁 무렵 이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약간의 취기어린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긴박함이 있었다. “득형아! 기도해줘.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아.” 무슨 일이 있는지 친구에게 물었다. 얼마 전 종합검진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악성인지 아닌지 검사 결과가 다음 날 나온다는 것이다.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괜찮은데, 와이프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 기도해줘.” 친구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물었다. “너는 괜찮아? 좀 어때?” 자신은 어떤지 묻는 물음에 친구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통곡하듯 울었다.
그의 울음소리가 조금 진정되면서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아내의 몸 상태가 걱정이 될 뿐 아니라, 혹시라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동안 아내에게 잘못했던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걱정과 미안함을 안은 채 긴장감으로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순간 나는 29년 전 그가 나를 안아 주며 위로해 주었던 때가 떠올랐다. 부둥켜안고 울었던 그때처럼 친구는 전화상이었지만 내 마음에 기대어 편안히 통곡하며 근심을 내려놓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주의 깊게 경청하기 보다는 쉽게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애도수업』은 캐시 피터슨이라는 여성이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매 장마다 귀한 레슨(lesson)을 담고 있다. 그 중에 벌침언어와 나비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때로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한 시도로 하는 말들은 ‘상처를 주는 말들’이 된다. 이러한 말들은 마치 꿀벌과도 같아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위협적이지 않은 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쏘게 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울지 말라”, “울어라”, “이만하면 됐어”, “그만 일어서야지”, “고인도 네가 그러는 걸 원치 않을 거야” 등의 말이다. 캐시 피터슨은 다음과 같은 말들도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한다.
“그는 더 좋은 곳에 있어.” 이 말은 사실일 수 있지만, 죽음으로 인한 상실이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가족들은 더 좋은 곳에 그가 있기 보다는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다른 천사가 필요했나보다.” 이 말은 언뜻 위로의 말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가혹한 분으로 만드는 말이다.
“그(녀)가 갈 때가 된 것 뿐이야.” 아무리 나이가 들어 죽었다 해도 ‘호상’이라는 말은 없다. 갈 때가 된 것을 누가 결정하겠는가? 어쩌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
“네가 대신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지?” 이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다. 따라 죽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
“배우자를 상실하는 것이 상처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잃은 때를 한번 생각해봐...” 이는 상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이다.
위로를 위해서는 함께 있어 주면서, 가만히 손잡아 주거나, 동성의 가까운 사람이라면 안아주는 것도 좋다. 말로 하려는 위로는 자칫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대신,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고 캐시 피터슨은 전한다.
첫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과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추억들을 나누는 것은 고인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귀감이 되었고 잊혀 지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가족들에게 위로를 준다.
둘째, 이 시기에 혹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고인이 얼마나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그리고 삶에서 이룬 성과들과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되새겨 주는 것도 좋다. 이는 슬픔 가운데 치료적인 효과를 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다.
▶ 다른 글 보기 |
|